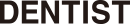2017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 참석 후기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윤 교수의 주제발표 서두는 사실상 치과계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부분으로 시작되었다. 그 함축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의료기관별 진료비 점유율이 치과 5.4%라는 적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패널토론자였던 손영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예비급여팀장이 언급한 내용과 같이 치과분야의 많은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진적 급여화가 단기간의 목표점이 아니라는 점 때문일까? 그러나 치과계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신호로 들리지만은 않았다.
’문재인케어와 치과의료‘라는 정책포럼의 주제와는 달리 문재인케어 자체에 대한 홍보강연의 뉘앙스가 풍기는 주제발표를 듣고 있으니, 지난달 27일과 31일에 개최되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정책포럼들의 기사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생각만이 강화되고 있었다.
당시 포럼 행사의 기사를 참고하면,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공급자의 희생을 담보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전례, ‘적정수가 보장’과 ‘보장성 강화’의 순서 잘못으로 인한 의료공급자의 붕괴우려 등의 다양한 반대논리에 부딪쳤으며, 의협 비대위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에 의하여 SNS상에서 치열한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과연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라는 결과물로 치과계는 안도할 상황인가에 대한 걱정이 일선 치과개원의로서 묘한 딜레마의 심정인 것이 사실이다. 전체 의료비에서의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의료소비자로서와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심정만으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걱정이 꽤나 크다는 생각이다.
다만 소위 ‘심평의학’이라는 난관의 첫 번째 장애요인으로 기재부를 들면서, 심평원의 삭감액과 조정액을 기재부의 심평원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과연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하다는 위안(?)을 받았다.
또한 여러 진영에서 함께 주장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동상이몽의 가장 큰 이슈대상인 ‘적정수가’라는 부분과 다양한 상호방향성으로의 ‘신뢰’라는 부분이 특히나 인상 깊었다는 것이 이번 포럼의 특징으로 다가왔다.
앞서 언급한 지난달의 포럼에서 정형선 건정심 부위원장이 발언했다는 급여해야 하는 것을 급여화 하겠다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전제조건은 ‘적정수가’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기도 하다.
먼저 ‘적정수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주관적이지만, 실제적이고 전형적인 예로써 임플란트 급여화의 과정과 운영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단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산출된 급여수가가 언론의 포격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지점을 제안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재료대라는 가시화된 자료를 시작으로 무형의 가치인 행위료가 위협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과도한 이익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일부 저수가로 유인행위를 일삼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행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폐해를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등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급여수가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태를 은근히 즐기는 정부와 각계의 시각들과 더불어 의료계를 마녀 사냥하듯 몰고 가는 형국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한 제반 상황들이 어쩌면 ‘적정수가’의 본질적 측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대정부, 대의료인 신뢰의 측면과도 관련된 문제이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주요 비판 요소 중의 하나인 의료전달체계라는 문제의 핵심 고리라는 생각이다. 즉,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의 강화는 결국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단지 얄팍한 인센티브 요소의 첨부와 평균치라는 잣대로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확진 안되면 보험 인정 불가’라는 그동안의 관료적 기준을 지양하고, 기관의 평균적 경향을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김윤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방법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개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평균치에 의해 통제받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소위 말하는 ‘심평의학’의 주요 축으로써, 결국 의료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질환과 코드라 하더라도 시술 난이도가 다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맞추다보면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는 지적도 의료인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적정수가와 신뢰의 문제로 바라본 이번 정책포럼의 평가를 지난달 31일의 대한병원협회 ‘Korea Health Congress’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정형선 건정심 부위원장의 발언을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는 정치적 표현으로 실무와는 다르다.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급여해야 하는 것을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고, 예비급여를 통해 왜곡을 막겠다는 데 핵심이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서, ‘정치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정치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감히 건널 수 없었던, 정부, 국민, 의료인 등의 다른 주체로 보이지만 결국 동일체인 각 진영 사이에 존재했던, 험난하고도 거친 강이 아니었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대선 공약,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등의 어설프게 포장된 표현문구들이 바로 ‘시각차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그동안 제시되었던 수많은 의료정책의 딜레마였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실제 임상을 하진 않는 정책수립 교수들의 한계점이라는 주위의 볼멘소리들의 근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 읽었던 칼럼의 내용을 첨언하면서 ‘정치적 표현’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철학은 영감을 주지만, 과학은 해법을 추구한다. 국가 정책은 이성과 냉철한 현실 판단 위에 설 수밖에 없다. ‘실사구시’에 기반 하지 않은 정치 행위는 주장의 옮김일 뿐이다. 철학과 과학의 조응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포위된 정치가 가치 있게 생존하고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