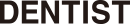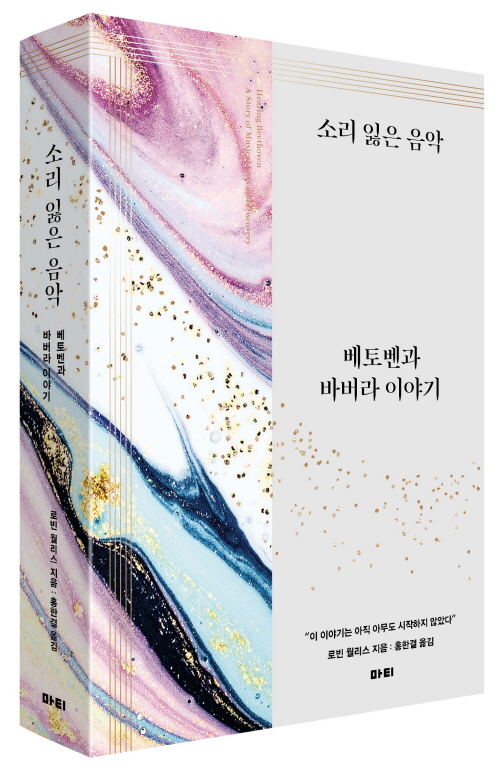
“그녀의 삶을 통해 베토벤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베토벤이 청각장애에 대처하며 보인 모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었다. 그는 별종도 괴물도 아니었다.” _ 본문 중에서
1800년대의 베토벤과 2000년대의 바버라는 후천적 청각장애라는 공통점이 있다. 음악학자 로빈 월리스는 아내 바버라가 청력을 잃은 후 곁을 지키며 그녀와 비슷한 장애로 고통받았던 베토벤의 말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베토벤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악성을 그저 받아 적어 음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대중이 기대하는 낭만주의적 천재 예술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반신반인, 괴팍한 천재와 같은 박제된 이미지나 영웅 신화에서 탈피해 베토벤의 창작 행위와 작품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탐구한다.
20대에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바버라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44살에 돌연 청력을 잃는다. 저자는 아내가 희미한 청각, 촉각, 기억, 시각을 동원해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에 감탄한다. 그녀는 청력 보조기로 청력을 키우고,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청각을 발달시킨다. 시대는 달랐으나 베토벤 역시 나팔형 보청기 같은 청각 보조기구에 의지해 작곡을 계속했으며, 귀가 나빠질수록 점점 더 다른 신체기관에 의지해 악기와 소통했다. 그라프, 브로드우드, 아라르 등 당대 피아노들 가운데 진동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을 찾았다.
귀가 들리지 않았어도 베토벤은 저자에 따르면 “늘 하던 방식대로” 작곡했다. 베토벤은 난청이 되기 전부터 악상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게 악보를 쓰는 작업은 연주나 마찬가지였다. 청력 상실 후 그의 작곡 활동을 미화하지 않은 점은 독자가 그동안 수많은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들었던 베토벤을 비로소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한다.
베토벤은 말년에 「교향곡 9번」, 「장엄 미사」, 「함머클라비어」나 「대푸가」 같은 후기 피아노 소나타 및 현악 사중주, 디아벨리 변주곡 등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사랑받는 곡들을 완성했다. 평단은 대부분 이를 역경을 딛고 쓴 작품들이라 평가했으나, 저자는 베토벤이 리드미컬하고 짧으며 특징적인 선율의 곡을 많이 쓴 이유로 청각장애인이 ‘리듬’을 가장 쉽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든다. 이는 바버라가 빠른 템포, 리듬으로 대표되는 재즈 공연에 가장 만족했던 경험과 일치한다.
아내를 통해 저자는 베토벤을 더 분명히 바라보고, 베토벤의 음악과 삶을 탐구할수록 아내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한다. 두 사람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했다. 이는 장애를 인정하고 한계를 넓히려는 시도다.
종이 위에서 고치고 다시 쓰기를 거듭하고, 소리를 들을 장치를 고안하고, 피아노와 세심하게 접촉하는 작곡가의 삶. 들을 수 없어도 아이들의 공연에 매번 참석하고, 지역사회 모임에 나가고, 단 하루를 즐거운 여행으로 만들고자 분투하는 여성의 삶. 이 둘의 평범하지만 비범한 성취는 삶을 향한 의지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_ 로빈 월리스
베일러 대학교(Baylor University)에서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다. 베토벤의 음악을 평생 연구해왔으며, 저서로 《베토벤의 비평가들》(Beethoven’s Critics), 《주목: 능동적 청취로 음악 입문하기》(Take Note: An Introduction to Music through Active Listening)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