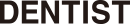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1971년 첫 연출작 <듀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헐리우드의 거장인 그가 정식으로 영화를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그는 이미 16살에 만든 영화를 동네 극장에서 상영했을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봤던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는 연출법을 자연스레 터득했다.
<파벨만스>는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그가 영화에 빠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영화계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주인공 샘(가브리엘 라벨)은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지상 최대의 쇼>를 처음 본 이후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피아니스트로 예술적 소양이 풍부했던 어머니 미치(미셸 윌리엄스)는 아들의 열정을 이해하지만, 컴퓨터 공학자인 아버지 버트(폴 다노)는 이를 잠깐의 취미로 치부한다. 스필버그는 샘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함께 가족사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아버지의 조수이자 친구인 베니(세스 로건)와 어머니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된 샘은 충격에 빠진다.
스필버그가 성장기에 부모에게 상처 입은 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E.T.>(1982)의 엘리엇은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A.I.>(2001)의 인조인간 데이비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난 후에도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한다. <캐치 미 이프 유 캔>(2003)의 프랭크 역시 자신을 떠난 어머니를 잊지 못한다. <슈퍼 에이트>(2011)의 조는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와 둘이 살며, 친구들과 함께 8mm 카메라로 영화를 만들며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 한다. 이들 작품에서 스필버그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신할 만한 존재를 등장시켜 주인공, 혹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위로한다. 그 존재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생명체로, 또는 로봇으로, 그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파벨만스> 속 스필버그의 개인사는 그의 영화를 이해하는 열쇠다.

자신이 찍은 영상에서 어머니의 비밀을 목격한 샘은 영화 촬영을 그만두기로 하지만, 결국 영화로 인해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샘은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샘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 역시 스필버그가 학창 시절 겪었던 경험담 그대로다. 샘은 학폭 때문에 주눅 드는 대신 카메라를 들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학생들은 샘이 만든 영화에 열광하고, 샘은 그런 그들을 보며 영화를 다시 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
스필버그에게 영화란 무엇일까. <파벨만스>는 그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준다. 영화는 관객에게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재미와 감동을 주어야 하며 종교나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스필버그는 50년 넘게 헐리우드의 역사와 함께하며 이를 증명해 온 진정한 시네아스트다.
3월 22일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