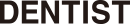의정부분회 양서영 회원
눈을 깜빡거리는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저마다 하던 몸짓을 멈추고 신발을 발에 꿰찼다. 서로가 발을 밟지 않도록 몸을 조금씩 구겨야만 했다. 가지런히 일번 언니부터 오 번 나까지 아빠를 중심축에 둔 채 각도기 대열로 발을 디뎠다.
“이 녀석, 왜 안 들어와? 한 번도 일찍 들어온 적이 없어. 어디 오기만 해봐라.”
아빠는 갈색 눈동자를 마블 영화의 악당처럼 움직이며 허리춤에서 가죽으로 된 띠를 조급하게 빼냈다. 허리띠의 쓰임새는 아빠에게는 여러 가지였다. 양복바지를 폼 나게 잡아주는 패션 완성품도 있었지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육아 계도용이었다는 게 아빠에게는 더 쓸모가 있었던 듯했다. 아빠의 허리띠가 제 자리를 벗어날 때 나는 허벅지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고는 했다.
언니는 두 손바닥을 바시시 비비더니 움츠린 어깨 위의 살짝 붉힌 뺨에 갖다 댔다. 큰오빠는 입술을 모은 채로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작은오빠는 옆집 삽살개를 멍하니 바라봤다. 삽살개는 작은 오빠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꼬리 흔들기를 자제하고 그냥 코만 벌름거리고 있었다. 막내 오빠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차례 막내 오빠는 늦게 왔다. 아빠는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주걱턱을 내미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분명했다. 저녁 늦게 집에 오는 것은 막내 오빠이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아빠의 성난 눈빛을 봐야 하는 것은 항상 나머지 형제들의 몫이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서 숙제도 하고 그래야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에잇!”
아빠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며 어지간히 양 볼에 힘을 주는 듯했다. 아빠는 뺨을 그러모으더니 바닥에 침을 퍽 내질렀다. 아빠의 숨소리가 내 귀에 묵직하고 가슬거렸다. 나는 운동화의 앞코에 눈동자를 던지고는 ‘노란색 두 줄 빨간색 한 줄’을 여러 번 마구 뇌 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옆집 나무의 그림자가 우리 집 마당으로 길게 뻗어오고 있었다. 허벅지에 손이 갔다. 도대체 몇 시간째였을까? 그 자리에 그만 풀썩 주저앉고 싶었다. 제기랄! 차라리 오빠가 멀리 도망쳐 어디론가 가 버렸길 바랐다. 아니지! 막내 오빠도 허리띠의 문신을 종아리에 새겨야 했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었다. 막내 오빠는 지금 이 사태를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일부터 해가 떨어지기만을 그래서 아빠가 잠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덜커덕하며 문 잠금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다. 언니와 나는 잠시 허공에서 눈이 마주쳤다. 여기저기 침을 삼키는 소리와 입맛을 다시는 쩝쩝 소리가 고막을 냅다 흔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막내 오빠는 하얀 이를 전부 드러내고 있었다. 내친김에 아빠와 우리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그윽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막내 오빠가 바지 앞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빙 둘러서 있는 우리들 앞으로 다가왔다. 껌을 한 개씩 내밀었다. 우리는 쭈뼛쭈뼛 어쩔 수 없이 껌을 받아들었다. 서로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뺄 수는 없었다. 막내 오빠는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빠 앞에 섰다. 막내 오빠는 웃음을 지으며 아빠에게도 껌을 든 손을 내밀면서 입을 크게 양옆으로 벌렸다.
아빠는 입술을 비스듬하게 모으더니 희번쩍 뒤로 돌아서서 애먼 화장실 쪽을 애써 봤다. 기필코 어깨가 들썩이는 아빠의 이가 몇 개 드러나는 것을 봐 버리고 말았다. 아빠의 손에서는 스르르 허리띠가 힘없이 풀려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조금 축축해져 왔다. 손에서 껌도 눅눅해져 있었다. 막내 오빠는 신발을 한꺼번에 벗어젖히더니 마루에 거침없이 올랐다. 그는 느닷없이 방정맞게 외치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