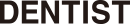[나 이렇게 산다] 2) 김 성 김성치과의원 원장
낮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치과의사로, 퇴근 후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나만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이들이 바로 여기 있다. 색다른 취미로 인생을 맛깔나게 살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만났다.

제3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일. 심사위원으로 초빙된 프로 사진작가가 눈을 떼지 못한 사진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 뻐꾸기가 탁란 하는 숙주새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뻐꾸기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뻐꾸기 탁란(붉은 머리 오목눈이)>이라는 작품. 올해 공모전에서 금상을 거머쥔 주인공은 바로 새 사진만 주야장천 찍어왔다는 원로 치과의사 김 성 원장(김성 치과의원)이었다.

새가 나타났다!…“10kg 카메라는 거뜬히 들고 뛰죠”
“새랑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면 참 좋을 텐데..그렇죠?(웃음) 지난 주말엔 화성 방조제에 갔는데, 한 건도 못 찍고 허탕 쳤어요. 사실 새 사진 찍기는 시간 죽이기의 연속이에요.”
역동적인 새의 모습을 어떻게 포착하느냐는 물음에 김 원장은 ‘기다리는 거죠 뭐. 쓸데없이 죽이는 시간만 많아요’라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촬영 기술이나 카메라 조작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다는 그는 사시사철, 그리고 매순간마다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새를 렌즈에 담는 게 좋아 사진 모델로 새를 선택했다.
“2009년에 함께 라운딩을 하던 동료가 취미로 새 사진을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농담 삼아 건넸는데, 그 이후로 8년째 새만 찍고 있네요. 별 다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시작한 취미였는데, 지금은 삶의 즐거움이 됐죠.”

산수(傘壽)를 바라보는 김 원장은 평일엔 현업에서 진료를 보고, 매 주말이면 20kg에 달하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출사 길에 오른다. 젊었을 적엔 등산, 테니스 등 활동적인 운동을 즐겼지만, 여든이 코앞이다 보니 사진을 찍는데도 체력소모가 상당하다.
“저 멀리 새가 등장하면 10kg이 넘는 거대한 렌즈와 카메라를 들고 500~1000미터를 잽싸게 달려가야 해요. 또 사진을 찍을 때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아무래도 전보다 순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숨이 찰 때가 많아요. 솔직히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땐 비틀비틀 하기도 해요.”
체력적 한계에도 그가 새를 향한 셔터를 멈출 수 없는 건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서다. 김 원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가 나타났을 때엔 몸이 힘든 건 싹 잊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뛰게 된다”고 했다.
“카메라 렌즈에 다양한 새의 움직임을 담기 위해선 끝없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해요. 서너 시간 대기하는 건 양반이죠. 추위 속에 하루를 꼬박 기다렸는데, 새의 깃털도 못 보고 돌아온 적도 많아요. 누가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못하죠. 인고 끝에 셔터를 연속으로 누르는 순간의 희열과 뿌듯함, 한 번 느끼면 잊지 못해요.”
출사 동지는 '아내'…80세까지는 달려보렵니다
김 원장의 출사 동지는 친구도, 동호회 회원도 아닌 아내다. 큰 목적은 사진이지만, 그에겐 사진을 핑계 삼아 주말마다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며 콧바람을 쐬는 시간이 소중하다. 아내는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한 오랜 기다림도 함께 하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도 많은데, 항상 아내가 옆을 지켜요. 카메라를 두 대 이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내에게도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는데, 사실 아내는 사진 찍는 덴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젠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아내가 답답해해요. 이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나 봐요.”

김 원장이 아내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수많은 작품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요청도 종종 있지만, 그는 부가 수입엔 욕심이 없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사진 공모전도 공모 대상이 치과의사여서 출사표를 던졌다”면서, 치과의사라는 본업에 열정을 다 하고 사진은 취미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저는 프로 사진작가도 아닐뿐더러 제 본업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지 않아요. 사진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무거운 장비를 챙겨 들고 출사를 다녀온 날이면 거의 쓰러지다시피 할 만큼 체력이 방전돼요. 하지만 그날 찍어온 사진을 밤 열두시까지 한 장 한 장 보다가 잠들어요. 언제까지 사진을 찍을 지 예상할 수 없지만, 아직은 사진을 찍는 게 참 좋은가 봐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다니지 않을까요?"
적어도 80세까지는 지금처럼 카메라를 잡고 싶다는 김 원장. 매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 새를 찾아 떠나지만 아직도 갈 곳이 많은가보다.
“시간이 나지 않아 제주도에서 새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엔 꼭 제주도에 가서 섬에 서식하는 새를 카메라에 담아야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